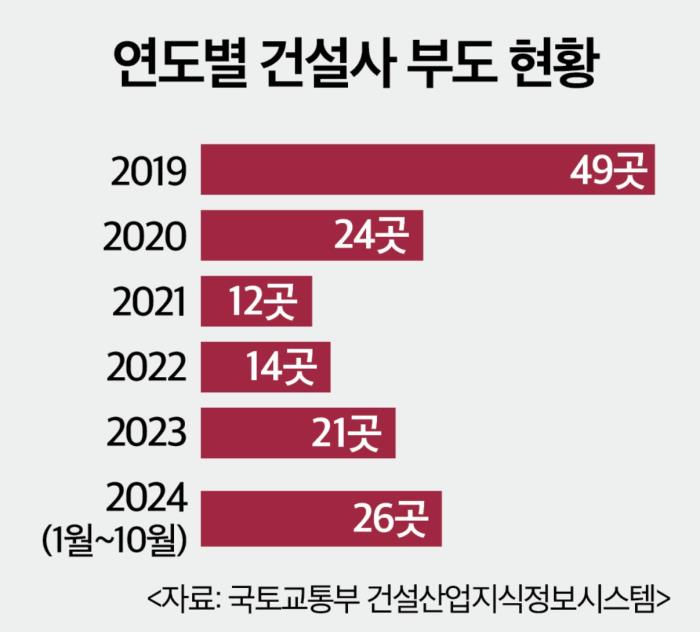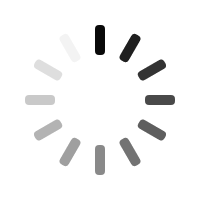(사진=픽사베이)
국내 증시가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상증자(유증) 남발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을 통한 자본조달은 기업 성장의 마중물이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지만, 최근의 유증은 본래의 취지를 벗어나 투자자 신뢰를 갉아먹는 악순환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근 현대차증권이 발표한 유증이 그 예입니다.
현재 전체 주식수가 3170만주인데, 2000억원 규모로 약 3000만주를 새로 발행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특별한 성장 비전이나 명확한 명분없이 결정한 것으로 시장은 해석하고 있습니다.
발표 후 주가는 곤두박질쳤고 소액주주들은 "이게 무슨 날벼락"이냐고 분통을 터트리고 있죠.
유증은 기업이 신규 투자와 연구개발, 설비 확장 등 성장 전략을 위해 자금을 조달하는 중요한 수단입니다.
하지만 국내 증시에선 기업들이 운영자금 충당이라는 명목 아래 빈번하게 유증을 남발하고 있죠. 매년 유증을 반복하거나 자본금을 단기간에 몇 배씩 늘리면서도 경영 성과는 부진한 사례를 보이고 있는 곳들도 허다합니다.
주식시장의 자금조달 취지가 무색해진 상황이죠.
예컨대, 한 코스닥 상장기업은 초기 30억원대의 자본금으로 시장에 데뷔했지만, 몇 년 사이 유증과 전환사채 발행을 반복하며 자본금을 수백억 원대로 불렸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적자 늪에서 벗어나지 못했고, 주가는 액면가를 밑돌며 투자자들에게 외면받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무분별한 유증은 주식시장의 균형을 심각하게 훼손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은 20년간 약 8배나 늘었지만, 주가지수가 지지부진한 이유이기도 합니다.
신규 상장으로 유입되는 자금보다 기존 기업들의 반복적인 유증으로 인해 공급 물량이 과도하게 늘어나며 하락세를 면치 못하고 있는 기업들이 많습니다.
이는 투자자들에게 손실을 안길 뿐만 아니라 시장 전반의 투자 심리를 위축시키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자본 조달과 투자를 매개하는 공간입니다.
하지만 과도한 자본조달이 시장의 기본 구조를 왜곡합니다.
이는 규제의 필요성을 시사합니다.
선진국의 사례를 보면, 미국과 일본은 유증을 통한 자금조달이 기업 성장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도록 사용 목적과 내역을 철저히 공시해야 합니다.
일본은 특히 자본조달 이후 실질적인 효과를 평가하는 감독 체계를 운영하며, 기업들이 자본을 방만하게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습니다.
국내 증시도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유증을 남발하는 기업들에 대한 사용 목적과 성과 공시를 강화하고, 반복적인 자본조달에 대해 심사 기준을 높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기존 주주들의 지분 희석을 막기 위해 대규모 유증의 높은 할인율 제한과 우선 배정권 강화 등 보호 장치도 마련해야 합니다.
좋은 기업은 자본 조달에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자체적으로 부가가치를 창출해 투자자들에게 배당 등으로 보답하며 지속가능한 성장을 도모하죠. 반면 증자 등 신주 발행에만 의존하는 기업은 투자자들의 돈을 소모하면서 시장 성장을 가로막는 역할을 할 뿐입니다.
지금이라도 정부와 금융당국이 기업의 자본조달 행태를 관리하지 않으면, 주식시장의 근본적인 신뢰 회복도 어렵게 될 것입니다.
투자자 보호와 시장 신뢰를 위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기업들의 자율성도 중요하지만, 시장이 균형잡힌 성장을 위해선 이같은 행태를 바로잡을 장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