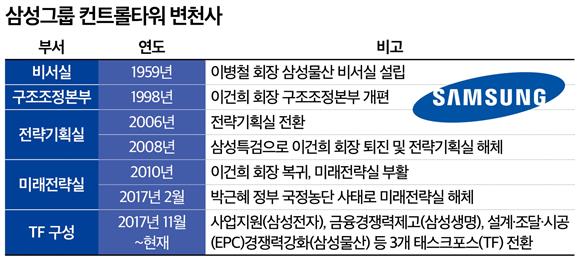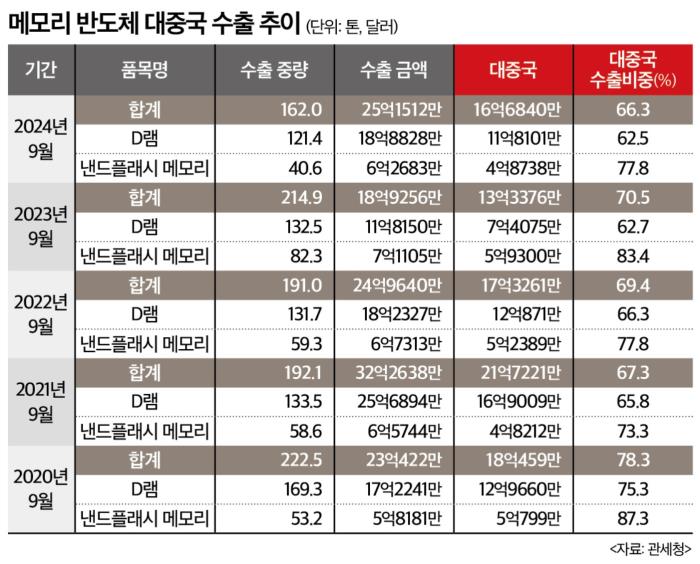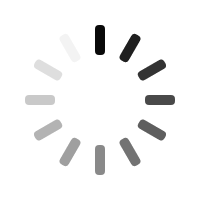케냐 나이로비 국립공원에서 기린 두 마리가 나뭇잎을 먹고 있다.
(사진=나이로비 AP/뉴시스)
대한항공은 아시아나항공과 합병 이후 시장 독과점을 우려하는 해외 경쟁당국의 조건부 승인을 얻기 위해 국내 저비용항공사(LCC) 티웨이항공과 에어프레미아에 회사 주요 매출 노선인 미주, 유럽에 대한 슬롯(항공사별로 배분된 공항의 이·착륙 시간)과 운수권(항공기로 여객과 화물을 탑재하고 하역할 수 있는 권리)을 이관했습니다.
그리고 이에 따라 운항편이 줄면서 이를 메워줄 신규 노선 창출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오일 머니를 앞세운 중동(카타르, 에미레이트, UAE) 등)항공사들의 입지가 넓어지며 이마저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한항공의 주요 매출처는 미주와 유럽 노선입니다.
일본, 동남아, 중국을 오가면서 벌어들이는 수익이 70% 이상인 LCC와는 달리 대한항공은 장거리 노선(미주·유럽)에서 발생하는 매출 비중이 50% 이상입니다.
특히 주력으로 하는 미주 노선이 샌프란시스코, LA, 시애틀, 뉴욕, 호놀룰루인데 아시아나와 합병을 심사하는 미국 법무부(DOJ) 승인을 득하기 위해 해당 노선의 슬롯 일부를 에어프레미아에 이관했습니다.
유럽 노선도 마찬가지입니다.
파리, 프랑크푸르트, 로마, 바르셀로나 등 4개 노선에 대한 운수권과 슬롯을 티웨이항공에 이관했습니다.
장거리 운항 경험이 없는 티웨이항공이 안정적인 취항을 유지해야지만 조건부 승인이 유지되기 때문에 대한항공은 한 번에 파리까지 운항이 가능한 A330-200 기재 5대를 내어주고, 운항승무원(기장·부기장) 100명을 파견했습니다.
알짜배기 노선 편수가 줄면서 매출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자, 대한항공은 이를 메꿀 노선으로 아프리카를 눈여겨보고 있습니다.
아프리카는 관광 수요와 제조 기업들의 수출이 늘 것으로 전망되는 대륙 중 하나입니다.
특히 아프리카 중에서도 동아프리카 관문으로 통하는 케냐 수도 ‘나이로비’ 직항 노선 개설을 엿보고 있습니다.
케냐는 유엔환경계획(UNEP) 등 국제기구와 각종 비정부기구(NGO) 본부가 자리 잡고 있을 뿐 아니라 탄자니아 접경 초원 지대의 세렝게티 국립공원 등 풍부한 관광 자원도 보유하고 있어 항공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곳입니다.
그러나 해당 노선은 카타르, 에미레이트 항공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악한 상황입니다.
이들은 두바이 도하를 경유해 가격을 낮췄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두 항공사는 한번에 400명을 실어 나를 수 있는 대형항공기 A380, B777 등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승객 400명을 태워 두바이 도하까지 한 번에 운항할 수 있는 기재들입니다.
두 항공사는 도하가 최종목적지인 승객과 나이로비가 최종목적지인 승객을 한 번에 태워 옵니다.
이는 인천국제공항을 패싱한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인천공항은 환승수요를 중동에 뺏기는 셈입니다.
중동 항공사들이 유럽, 아시아 가교로서의 지리적 이점을 활용해 한국에서 유럽으로 가는 승객 수요를 자국에서 환승시키는 전략을 꾀하는 것입니다.
합병을 위해 알짜배기 노선을 이관, 앞으로 얼마나 더 내줘야 할지도 모르는 불확실한 처지에 놓인 대한항공은 매출 신장이 다급합니다.
아프리카를 새로운 먹거리 노선으로 만들려고 하지만 쉽지 않습니다.
대한항공이 물색을 시작하기 훨씬 이전부터 중동 항공사들은 텅텅 빈 여객기여도 상관없으니 일단 도하를 찍고 아프리카로 가는 노선을 운항해왔기 때문입니다.
처음엔 실적이 나지 않았지만 점차 승객이 늘면서 아프리카로 향하는 노선은 중동 항공사들이 우위를 점한 상황입니다.
업계 관계자는 “오일 머니를 앞세운 카타르나 에미레이트항공은 미주~아프리카 노선 초반 운항할 때 텅텅 빈 좌석이어도 편수를 줄이거나 중단하지 않았다”면서 “지금 해당 노선 장악은 수익성이 날 때까지 기다려준 결과여서 대한항공이 신규 개설해도 탑승률을 장담할 수 없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