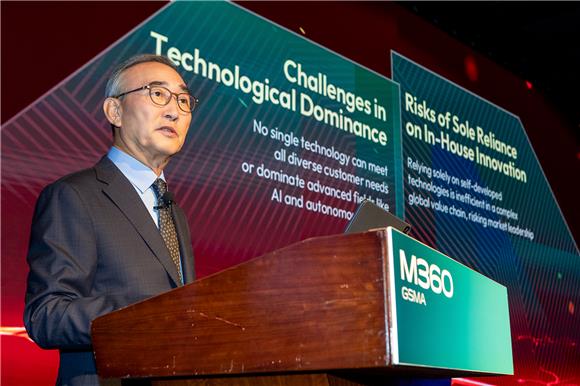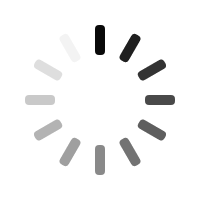11월 1일 국정감사 종료와 함께 더불어민주당은 2일 ‘김건희 국정농단 범국민 규탄대회’를 대규모로 연다.
이것은 여야 정쟁이 국감장에서 장외로 확대된다는 신호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11월 15일)·위증교사 사건(25일)의 1심 선고일이 다가오면서 야권의 대응도 더 거칠어지고 있다.
22대 첫 국정감사는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과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수사 재판을 둘러싼 정치공방만 하다 끝냈다.
국감 NGO모니터링단은 이런 국감 성적에 낙제점수(D-)를 매겼다.
이래 놓고는 정쟁의 무대를 장외로 옮기겠다고 하니 답답하다.
이번 국감은 처음부터 ‘정책·민생국감’ 대신 ‘정쟁국감’으로 흘러갈 공산이 컸다.
왜냐하면 야당은 ‘김건희 심판 국감’으로, 여당은 ‘이재명 대표 사법 방탄 심판 국감’으로 상대를 정조준했기 때문이다.
야당은 김 여사 의혹 총공세에 나서며 이를 발판으로 특검법을 재발의하겠다는 계획이고, 여당은 이 대표의 각종 혐의 재판에 따른 사법 리스크를 국감의 핵심 타깃으로 설정해 맞불 공격에 나서겠다는 구상이었다.
야당은 대부분의 상임위에서 김 여사 의혹에 당력을 집중했다.
하지만 김 여사 의혹에 대한 결정적 ‘한 방’을 끌어내지 못했다.
여당 역시 김 여사 의혹 방어에 급급한 나머지 민생은 외면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여기에 일부 의원들과 피감기관 관계자들의 욕설, 막말, 추태까지 난무하면서, 이번 국감역시 최악의 ‘정쟁국감’이 되었다는 오명 앞에서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다.
또다시 국감 무용론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김 여사와 이 대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난무하면서 행정부 활동을 입법부가 견제하고 대안을 제시한다는 원래 취지는 실종됐다.
김 여사가 연루된 ‘명태균 사태’라는 정국의 블랙홀 앞에서 국감의 정쟁성과 비효율성은 극대화되었다.
일반 증인 채택과 잇단 불출석, 과도한 동행명령장 발부는 ‘정쟁국감’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례다.
하루 수십 개 기관을 불러놓고 한 건의 질의도 하지 않는 구태, 생중계 장면도 아랑곳없는 막말과 추태 남발도 여전했다.
국정감사 NGO모니터링단이 오죽했으면 ‘D-’성적표를 줬겠는가. 결코 지나친 평가가 아니다.
특히, 민주당 소속 정청래 법제사법위원장과 최민희 과학기술방송통신위원장의 ‘마이크 갑질’이 도를 넘었다.
국감 NGO 모니터링단의 보고서에 따르면 두 위원장은 의원 평균 질의 시간의 5배 이상 발언했다.
두 위원장은 여당 의원에 대해 ‘발언권 중지’ 조치도 반복해 취했다.
정치권이 갑질과 정쟁을 중단하지 않는다면 오래전부터 제기된 국감 무용론의 확산을 막지 못할 것이다.
민생과 공공성을 추구해야 할 우리정치가 어쩌다 권력장악을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정쟁의 저질정치로 추락했는지 참담하다.
민생·경제·안보·의료 등 다방면의 현안이 즐비하고, 인구소멸·기후위기 등 국가적 과제도 산적한데 국감이 ‘이재명 방탄 대 윤석열 탄핵’이라는 정쟁구도에 갇혀있다니 답답하다.
한국 정치가 이 대표의 부도덕을 김 여사의 부도덕으로 덮고 물타기하면서 무한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있다.
대한민국 민생이 이들의 권력욕과 정쟁을 위한 인질극에 붙잡혀있다는 게 딱하다.
정치권의 ‘인질극 정치’로 인해 대한민국 민주공화국의 민생과 공공성이 볼모로 붙잡혀서 퇴행하고 있는 것은 통탄할 일이다.
4·10 총선 이후 국회를 장악한 야당의 독주와 타협 없는 정부·여당의 강경 노선을 바라보는 국민의 시선은 차갑다.
이대로 계속 정쟁만 벌인다면 국민의 정치 불신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정치권은 정쟁을 중단하고 협치로 돌아가기를 바란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