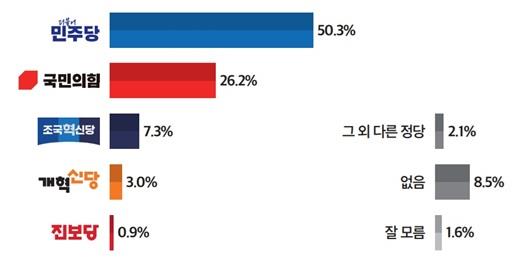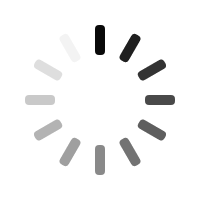[뉴스토마토 차종관 기자] 동덕여자대학교 학생들의 남녀공학 전환 저지 투쟁이 시작된 지도 보름이 넘었습니다.
상황을 지켜본 기자의 단상을 전합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투쟁의 본질이 ‘학교의 불통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당국이 비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학생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학보사가 가파른 언덕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어도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 의해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학생 반대에도 상경계열 전공 통폐합 등 비민주적 학사행정을 한 점 △전임 교원 확대 요구를 묵살한 점 등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학생 A씨는 "또다시 학생과의 상의 없이 사안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불안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도 학교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자보를 붙이는 등 온건한 방식으로 시위를 매년 해왔음에도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됐다"라고도 했습니다.
20일 학생총회가 열린 동덕여자대학교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장기간 시위가 이어지며 언론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현장을 '폭력' 내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왜' 이 시위를 하고 있는지 원인과 맥락을 짚은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현상 전달에 머무른 보도가 나가자 학생들을 향해 혐오·위협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혐오와 위협을 또 다른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학교 측이 피해 금액을 최대 54억원이라 전하자 '손해배상'에만 집중한 숫자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를 협박하려는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항변해도 대중들을 자극하려는 보도 추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 당국의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는 종이 쪽지. (사진=뉴스토마토)
어느 기자는 학생들을 '폭도'라며 '신상'을 털겠다고 선언한 신남성연대 집회에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학교에 무단 침입한 남성들이 붙잡히자 '젠더갈등이 격화됐다'며 프레임을 덮어씌우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엄연한 '젠더폭력'이지만, '젠더갈등'으로 왜곡하자 실제 문제와 책임 소재는 금방 가려졌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이기인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투쟁을 '비문명' 내지 '테러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 되어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지언정,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검증되지 않은 채 따옴표가 쳐지며 무분별하게 기사화 됐습니다.
언론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언어로 본질을 호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학생들은 언론이 문제의 본질보다 일부 자극적인 현상만 보고서 기사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B씨는 "언론에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학생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만 비춘 점이 안타깝다"며 "우리가 왜 이 시위를 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투쟁을 둘러싼 조롱과 위협은 여대라는 공간의 필요성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학생 C씨는 "여성이 하나의 사람으로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대라는 울타리는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진행 중인 동덕여자대학교 정문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대학의 불통행정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동덕여대만이 아닙니다.
건국대에서는 무전공제 도입 과정에서 대학본부가 총학생회에 전달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학칙 개정안을 올려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는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해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 속 공학 전환과 학과 통폐합 등의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동덕여대와 같은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보도를 하기를, 대학 당국은 학생들과의 소통에 진심으로 나서기를,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
newstomato.com | 차종관 기자
상황을 지켜본 기자의 단상을 전합니다.
학생들은 입을 모아 투쟁의 본질이 ‘학교의 불통 행정’이라고 말했습니다.
학교 당국이 비민주적으로 의사 결정을 하고 학생을 배제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학보사가 가파른 언덕길의 위험성에 대해 경고했어도 학교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치했다가 쓰레기 수거 차량에 의해 학생 사망사고가 발생한 점 △학생 반대에도 상경계열 전공 통폐합 등 비민주적 학사행정을 한 점 △전임 교원 확대 요구를 묵살한 점 등 사례는 수없이 많습니다.
학생 A씨는 "또다시 학생과의 상의 없이 사안이 진행되는 것에 대해 학생들의 불안과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지난해에도 학교에 의견을 전달했지만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며 "대자보를 붙이는 등 온건한 방식으로 시위를 매년 해왔음에도 의견 반영이 전혀 안 됐다"라고도 했습니다.
20일 학생총회가 열린 동덕여자대학교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장기간 시위가 이어지며 언론 보도도 쏟아졌습니다.
다만 대부분의 보도가 현장을 '폭력' 내지 '불법'으로 규정하는 데 그쳤습니다.
'왜' 이 시위를 하고 있는지 원인과 맥락을 짚은 기사는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현상 전달에 머무른 보도가 나가자 학생들을 향해 혐오·위협성 댓글들이 달렸습니다.
일부 언론은 혐오와 위협을 또 다른 기사의 헤드라인으로 그대로 받아썼습니다.
학교 측이 피해 금액을 최대 54억원이라 전하자 '손해배상'에만 집중한 숫자 보도도 이어졌습니다.
학생들이 "우리를 협박하려는 용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고 항변해도 대중들을 자극하려는 보도 추세를 바꿀 수는 없었습니다.
학교 당국의 문제를 지적하며 민주적 절차를 요구하는 종이 쪽지. (사진=뉴스토마토)
어느 기자는 학생들을 '폭도'라며 '신상'을 털겠다고 선언한 신남성연대 집회에 마이크를 들이밀었습니다.
학교에 무단 침입한 남성들이 붙잡히자 '젠더갈등이 격화됐다'며 프레임을 덮어씌우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에게 가해지는 공격은 엄연한 '젠더폭력'이지만, '젠더갈등'으로 왜곡하자 실제 문제와 책임 소재는 금방 가려졌습니다.
개혁신당의 이준석 의원과 이기인 최고위원은 학생들의 투쟁을 '비문명' 내지 '테러 행위'로 규정하기도 했습니다.
정치인이 되어 갈등 해결을 위해 노력하지는 못할지언정, 특정 집단을 공격하는 방식으로 지지세를 결집하려는 시도는 비판받아야 마땅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발언은 검증되지 않은 채 따옴표가 쳐지며 무분별하게 기사화 됐습니다.
언론은 공론장으로서의 역할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조회수를 위해 자극적인 언어로 본질을 호도하는 데 급급했습니다.
학생들은 언론이 문제의 본질보다 일부 자극적인 현상만 보고서 기사를 쓴다고 비판했습니다.
학생 B씨는 "언론에서 문제의 본질을 호도하고 학생들의 투쟁을 폭력적으로만 비춘 점이 안타깝다"며 "우리가 왜 이 시위를 하고 있는지에 더 집중해 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학생들의 투쟁을 둘러싼 조롱과 위협은 여대라는 공간의 필요성을 다시금 드러냅니다.
학생 C씨는 "여성이 하나의 사람으로 온전히 존중받을 수 있는 공간으로서 여대라는 울타리는 여전히 존재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공학 전환 반대 시위가 진행 중인 동덕여자대학교 정문의 모습. (사진=뉴스토마토)
대학의 불통행정으로 학생들이 피해를 본 사례는 동덕여대만이 아닙니다.
건국대에서는 무전공제 도입 과정에서 대학본부가 총학생회에 전달한 내용과 다른 내용으로 학칙 개정안을 올려 학생들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성신여대에서는 신설되는 국제학부에 외국인 남학생 입학을 허용하겠다고 해 학생들의 반대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대학들이 학령인구 감소 속 공학 전환과 학과 통폐합 등의 카드를 꺼내는 상황에서 학생들의 의견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면 동덕여대와 같은 갈등이 촉발될 수밖에 없습니다.
언론이 갈등을 조장하기보다 문제 해결을 위한 보도를 하기를, 대학 당국은 학생들과의 소통에 진심으로 나서기를, 동덕여대 학생들의 투쟁이 승리를 거둘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자도 끝까지 지켜보겠습니다.
차종관 기자 chajonggwan@etomat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