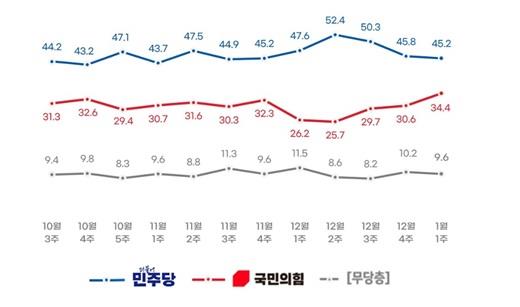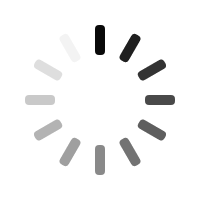동해의 매서운 겨울바람을 맞으며 새해 첫 해돋이를 보러 갔습니다.
네 살배기 아이에게 새롭게 떠오르는 해를 보여주고 싶어 성인이 된 이후 처음으로 해돋이를 찾았는데요. 정작 아이는 뜨는 해보다 발밑의 모래에 더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일일지도 모릅니다.
매일 같은 모습으로 뜨고 지는 해를 두고, 우리 어른들은 왜 이토록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걸까요.
단순히 지구의 자전 현상에 불과한 일출이 우리에게 새로운 시작과 희망이라는 상징으로 자리 잡은 이유는, 아마도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염원 때문일 것입니다.
어둠 속에서 솟아오르는 붉은 태양은 그 자체로 어떤 시련도 이겨낼 수 있다는 용기를 주는 듯합니다.
특히 올해는 그 상징적 의미가 유난히 절실하게 다가옵니다.
지난해 12·3 비상계엄 선포와 그로 인한 정치·사회적 혼란, 그리고 제주항공 참사로 인한 충격이 여전히 우리 사회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새해 인사를 나누며 '평안한 한 해 되시길 바랍니다'라는 말이 유독 많이 오갔는데요. 이는 단순한 안부 인사가 아니라 깊은 공감과 위로가 담긴 진심 어린 기원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해는 매일 다시 뜬다는 것을.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도 결국 동쪽 하늘은 밝아오고, 차가운 겨울이 지나면 봄은 어김없이 찾아온다는 것을. 4살 아이가 보여준 것처럼, 어쩌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원대한 포부가 아닐지도 모릅니다.
지금 이 순간 발밑의 작은 기쁨을 발견하고 일상의 소소한 평화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야말로 새해 우리가 가져야 할 진정한 소망이 아닐까요.
을사년 새해, 우리 모두의 마음속에 떠오른 태양이 희망과 용기의 빛으로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그 빛으로 서로를 비추고 감싸안으며 함께 평안한 한 해를 만들어가기를 소망합니다.
2025년 첫 해가 뜨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