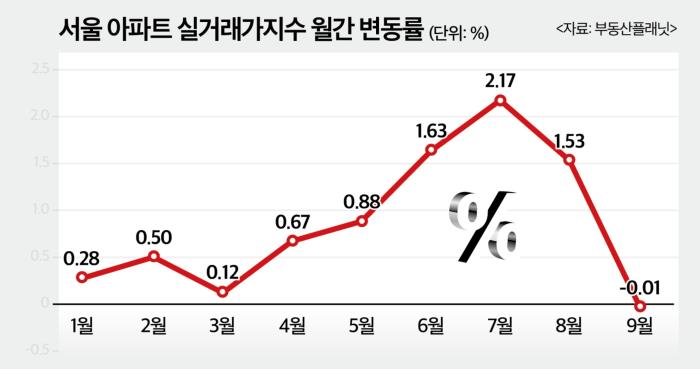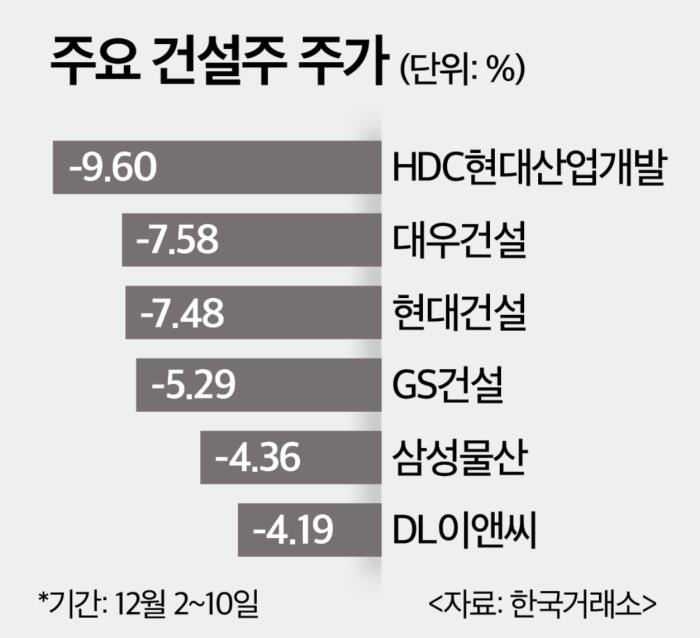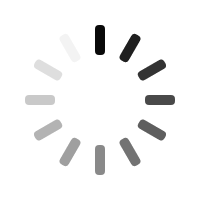[뉴스토마토 유지웅 기자] 군 생활 내내, 대공 경계 업무를 봤습니다.
훈련 때면 "대공비상! 대공비상!"을 외쳤죠. 군용헬기가 상공에 떴고, 계엄군이 들이닥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알 수 있었죠. 이상한 대통령의 기괴한 계엄선포 직후, 헬기 3대가 연이어 나타났으니까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이 한 청년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봉쇄된 걸 취재하다, 급히 본청으로 뛰어갔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진 헬기에선, 계엄군이 쏟아져 나올 터였죠. 국회에 대한 무력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조심하라 했고, 분명 전 "난 너만 생각해"라고 답했습니다.
왜 뛰어갔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뭐라도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본청에 갔으면 본청에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굳이 또 헬기가 착륙한 지점을 향했습니다.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데, 내부에만 있으면 알 수가 있나요.
진압 대상이 '국회'라는 것만 빼면,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본청 측면에서, 특수부대원들이 은밀한 잠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기자'니까요.
멋진 군복, 세련된 장비, 훤칠한 키, 다부진 근육. 이후의 순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했거든요.
타고난 반골 기질도 그 순간만큼은 자제력을 발휘하더군요. 모든 언론은 통제를 받고(포고령 3호), 이를 위반하면 '처단'(계엄법 14조) 당한다는 생각에 겸손해졌습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걸 가까스로 버텼고 '명령'에 따라 벽면에 다가가 섰습니다.
한 팔에 1명씩. 특전사 2명이 제공하는 결박 서비스를 누렸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전사의 면모가 빛났습니다.
"케이블 타이 가져와!"
FPS 게임 속 악당처럼,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게 될 신세였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손이 묶이고 나면, 회사에 보고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연락두절 돼버린 막내 기자라니. 혹독한 시련이 닥칠 게 분명했습니다.
계엄군보다 선배들이 무서웠던 거죠. 살아야겠단 생각에, 노가다를 하며 배웠던 '형님'이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니, 형님들. 이건 아니잖아요."
형님들은 벽에 등을 댄 채로 앉으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한번 앉게 되면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삭제된 후 풀려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형님들이 봐준 게 분명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작 바닥에 내다 꽂혔을 테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봐줬든 안 봐줬든, 윤석열 명령에 따랐으니까요.
훈련소에서 "군인은 상관의 명령 복종해야 한다"길래, 정훈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위법하고, 국가·국민에 반하는 명령'이면요?"
총칼로 무장한 군인이라면, 더욱이 특수부대라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기본적인 물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요.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
newstomato.com | 유지웅 기자
훈련 때면 "대공비상! 대공비상!"을 외쳤죠. 군용헬기가 상공에 떴고, 계엄군이 들이닥친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사실, 누구라도 알 수 있었죠. 이상한 대통령의 기괴한 계엄선포 직후, 헬기 3대가 연이어 나타났으니까요.
1980년 5월 광주에서 계엄군이 한 청년을 곤봉으로 내리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국회가 봉쇄된 걸 취재하다, 급히 본청으로 뛰어갔습니다.
시야에서 사라진 헬기에선, 계엄군이 쏟아져 나올 터였죠. 국회에 대한 무력진입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뜻이었습니다.
'광주'가 떠올랐습니다.
여자친구가 조심하라 했고, 분명 전 "난 너만 생각해"라고 답했습니다.
왜 뛰어갔는지는 지금도 의문입니다.
본능적으로 '뭐라도 해야 한다'고 느꼈어요.
본청에 갔으면 본청에만 있었으면 됐을 텐데, 굳이 또 헬기가 착륙한 지점을 향했습니다.
어디로 들어올지 모르는데, 내부에만 있으면 알 수가 있나요.
진압 대상이 '국회'라는 것만 빼면, 멋진 장면이었습니다.
본청 측면에서, 특수부대원들이 은밀한 잠입을 시도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핸드폰을 꺼내들고 그들을 촬영했습니다.
단순한 이유였습니다.
저는 '기자'니까요.
멋진 군복, 세련된 장비, 훤칠한 키, 다부진 근육. 이후의 순간은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순식간에 제압당했거든요.
타고난 반골 기질도 그 순간만큼은 자제력을 발휘하더군요. 모든 언론은 통제를 받고(포고령 3호), 이를 위반하면 '처단'(계엄법 14조) 당한다는 생각에 겸손해졌습니다.
발을 걸어 넘어뜨리는 걸 가까스로 버텼고 '명령'에 따라 벽면에 다가가 섰습니다.
한 팔에 1명씩. 특전사 2명이 제공하는 결박 서비스를 누렸습니다.
조금의 빈틈도 허용하지 않는 대한민국 특전사의 면모가 빛났습니다.
"케이블 타이 가져와!"
FPS 게임 속 악당처럼, 두 손이 뒤로 묶인 채 차디찬 땅바닥에 엎드리게 될 신세였습니다.
그때 든 생각은 '손이 묶이고 나면, 회사에 보고를 못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초유의 비상계엄 사태에, 연락두절 돼버린 막내 기자라니. 혹독한 시련이 닥칠 게 분명했습니다.
계엄군보다 선배들이 무서웠던 거죠. 살아야겠단 생각에, 노가다를 하며 배웠던 '형님'이란 단어가 자연스럽게 나왔습니다.
"아니, 형님들. 이건 아니잖아요."
형님들은 벽에 등을 댄 채로 앉으라고 재차 요구했지만, 한번 앉게 되면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았습니다.
버티고 버티다가, 결국 핸드폰으로 찍은 영상이 삭제된 후 풀려났습니다.
지금 생각해 보면, 형님들이 봐준 게 분명합니다.
그게 아니라면, 진작 바닥에 내다 꽂혔을 테죠. 고마우면서도,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봐줬든 안 봐줬든, 윤석열 명령에 따랐으니까요.
훈련소에서 "군인은 상관의 명령 복종해야 한다"길래, 정훈장교에게 물었습니다.
"'위법하고, 국가·국민에 반하는 명령'이면요?"
총칼로 무장한 군인이라면, 더욱이 특수부대라면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기본적인 물음이라고 봅니다.
우리는 이미 여러 번 경험했으니까요.
유지웅 기자 wiseman@etomato.com